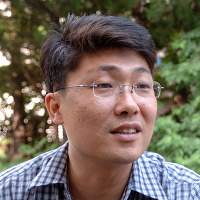이상훈(기후변화행동연구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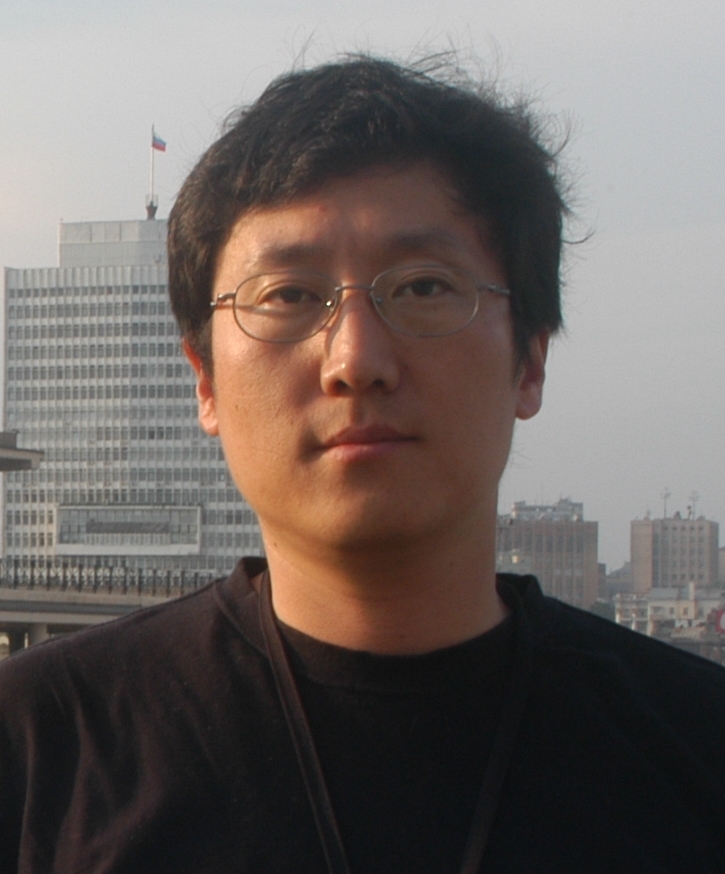
기후 영웅 앨 고어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06년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대의를 외쳤다면 이번엔 책이다. 교토의정서 이후의 중·단기 감축 목표와 장기 감축 행동 규범을 결정짓기로 예정된 역사적인 코펜하겐 회의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는 ‘우리의 선택: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간했다.
앨 고어는 가까운 미래 시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받을 질문을 예상한다. 먼저, 이런 고통스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당신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눈앞에서 북극의 빙산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대신에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받기를 희망할 것이다. “당신들은 어떻게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여 많은 이들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기후 위기를 해결했습니까?”
앨 고어의 주장처럼 기후 협상의 미래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미국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기존 에너지 산업계의 저항을 넘어 저탄소 경제를 위한 기반 구축에 우선순위를 둘 때 미래의 희망은 싹틀 수 있다. 이런 변화를 가늠하는 잣대는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청정에너지 안보법’의 통과 여부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미국이 기후협상에 복귀하려면 미국의 중기 감축목표를 명시한 이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코펜하겐 회의 개막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는 대신 어두운 전망만 늘어가고 있다. 온실가스를 40% 넘게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향적인 협력이 없다면 협상 타결은 어렵다. 그런데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오바마는 변화나 희망을 말하지 않았다. 미·중 정상은 기후협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새로운 의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을 위해 올해 사전 회의를 두 번이나 추가로 열었지만 마지막 열린 11월 7일 바르셀로나 사전 회의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기후협상의 실패가 초래할 수 있는 파국적 결과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는 변명을 미래 세대에게 늘어놓을 순 없다.
이미 2007년에 발간된 IPCC 제4차 평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충분히 정확하고 상세하게 예측되었다.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기후변화 대응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라고 둘러대기도 민망하다. 이미 세계 2500백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과학기술적 성과와 정책적 대안을 집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까지도 제시했기 때문이다. 연간 세계 GDP의 0.12% 감소만으로 기온 상승을 2℃ 내외에서 막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500ppm 내외에서 안정화할 수 있다고 IPCC는 4차 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에서 설명하고 있다.
누가 기후협상을 이끌어 가는가? 흔히들 사람들은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유럽연합이 기후협상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미국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주도하는 중국이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협상을 밀어붙이는 힘은 협상 플레이어들 배후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지구가 보내는 경고, 기후변화의 실재가 가장 큰 협상 동력이고 지구의 경고를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과학자, 그리고 과학적 보고서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생활양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환경단체와 지자체, 녹색리더 등이 기후협상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코펜하겐의 전망은 북유럽의 날씨만큼 흐리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실재하고 풀뿌리 기후 행동이 확산되는 한 언젠가 기후협상은 타결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너무 오래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쳤다”는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97년 교토회의처럼, 코펜하겐에서 극적인 반전이 펼쳐지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것일까? 미·중의 깜짝 쇼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한국에너지신문 2009년 11월 20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생각 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펜하겐... 그 이후 (0) | 2010.01.11 |
|---|---|
| 월요일은 ‘고기 안 먹는’ 날 (0) | 2009.12.06 |
|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때 (0) | 2009.11.13 |
| 기후변화 심리학 (0) | 2009.10.26 |
| '그린오션' : 기후변화시대 기업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0) | 2009.10.06 |